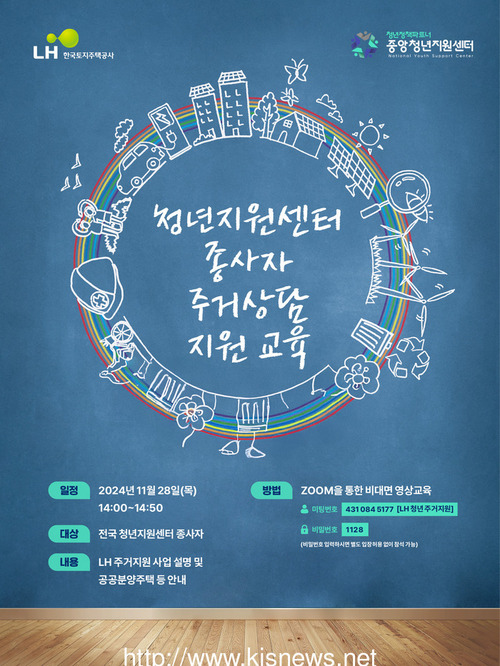땅속에 감춰진 서울의 역사를 찾아서 서울역사편찬원, '땅이 품은 서울사(史)' 발간
8월 23일부터 서울역사편찬원 누리집에서 무료 전자책 서비스 제공, 공공도서관 열람도 가능
땅속에 감춰진 서울의 역사를 찾아서 서울역사편찬원, '땅이 품은 서울사(史)' 발간8월 23일부터 서울역사편찬원 누리집에서 무료 전자책 서비스 제공, 공공도서관 열람도 가능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서울역사편찬원은 발굴 유적을 통해 서울의 역사를 풀어낸 서울역사강좌 제18권 '땅이 품은 서울史'를 발간했다. '땅이 품은 서울史'는 서울 발굴 유적을 집중 조명하여 땅속에 감춰졌던 서울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풍납토성 등 서울의 대표적인 발굴 유적을 포함해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던 발굴 유적들을 주제로 선정했고, 고고학자료와 문헌자료를 풍부히 수록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 책에서는 1961년부터 시작된 서울 발굴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풍납토성 ▴몽촌토성 ▴종로 신영동 유적 ▴영국사와 도봉서원 ▴성동구 행당동 주개장 유적 ▴노원구 초안산 분묘군 ▴청진동·공평동 유적 ▴청계천 ▴안동별궁 ▴경복궁 등 총 10곳의 발굴 현장을 통해 서울의 역사 이야기를 담았다. 먼저, 서울의 발굴 역사는 서울의 도시발달사와 맥락을 함께 한다. 광복 이후 서울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발굴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1970년대 강남 개발을 위한 발굴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88년 올림픽 개최라는 국가적 행사를 위해 강북의 궁궐들을 복원하는 발굴이 추진됐다. 이 책이 담고 있는 서울 발굴의 역사는 서울이 도시로 발달하는 과정의 또 다른 모습이다. 서울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600년 조선왕조의 수도인 ‘한양’은 쉽게 떠올리지만 2천년 전 한반도의 주요 고대국가인 백제의 첫 수도가 서울에 있었던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준비를 계기로 몽촌토성에 대한 첫 발굴조사가 시작되고, 1990년대부터 시작된 풍납토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서울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뒤집는 결정적 계기였다. 청계천은 20세기 서울의 변화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일제강점기 ‘개천’에서 ‘청계천’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광복 이후에는 서울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천변에 무허가 판잣집이 즐비했다. 이러한 모습은 청계천의 ‘복개’가 이루어지고 1971년 청계고가도로가 완공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갔다. 사람과 환경을 고려하는 도시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된 이후 2003년 청계천 복원공사로 콘크리트 밑에 가려졌던 청계천이 다시금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발굴조사도 진행되면서 조선시대 청계천 유적들도 우리 앞에 되살아났다. 또한 서울의 땅에는 다양한 시대상과 사상이 공존한다. 서울은 고려시대 남경이었지만, 고려시대의 유적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 종로구 신영동, 서초구 원지동, 강북구 수유동 등지에서 고려시대 유적들이 발굴되어 고려시대 서울의 일면을 파악하게 됐다. 특히 최근 경복궁 북부 일대 또는 청와대 일대의 발굴 성과를 보면, 이 일대에 고려시대 궁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고려시대 유적을 통해 당대의 찬란한 역사·문화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서울에는 불교와 유교가 공존하는 땅도 있다. 바로 서울 도봉구의 영국사 터 또는 도봉서원 터이다. 영국사는 고려시대 사찰로 금석문과 문헌자료에서만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2012년 도봉서원 터 발굴조사에서 다수의 고려시대 금속공예품이 발견되면서 이곳이 영국사 터였음이 밝혀졌다. “도봉은 옛 영국사가 있던 터이다.”라는 문헌의 내용이 실제로 증명된 것이다. 이는 역사학계는 물론 종교계의 이목까지 끌었고, 현재까지도 논의 거리가 많은 유적이다. 그리고 발굴은 서울의 귀중한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게 하거나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내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도성 10리 안에 무덤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그렇다면 도성의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에 묻히게 됐을까? 조선시대의 문헌자료와 발굴 유적을 함께 살펴보면, 이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유적이 도봉구와 노원구에 흩어져 있는 초안산 분묘군이다. 초안산 분묘군은 내시들을 비롯하여 중인, 내시, 궁녀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묻힌 일종의 공동묘지이다. 2000년 조사 당시 1,143기의 무덤과 182건의 비석, 511건의 상석이 남아 있었다. 그동안 초안산 분묘군에 대한 보존과 관리는 다소 미흡했지만, 이제는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추후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종로구 안국동 서울공예박물관은 본래 안동별궁이었다. 안동별궁은 이전부터 왕족들의 거처로 사용됐지만, 특히 고종 즉위 이후 어의궁을 대신하여 가례 장소로 조성하며 크게 활용된 별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워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안동별궁에 대한 문헌자료와 발굴 자료를 총망라하여 그 흔적을 책에 담았다. 발굴을 통해 고귀한 유물들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간 생활과 밀접한 쓰레기들도 많다. 그런데 발상을 전환하면 쓰레기를 통해 시대상을 읽을 수 있다. 2009년 발굴한 성동구 행당동 주개장 유적이 그러하다. ‘주개’란 가정이나 식당 등의 주방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의미하며, 행당동 일대의 유적은 일제강점기 쓰레기 유적에 해당한다. 이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은 물론 행당동 일대의 변화상과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던 사회 분위기까지 읽어볼 수 있다. 땅속의 쓰레기는 이제 시대를 읽는 일종의 보물이 된 것이다. 이 책은 서울역사편찬원에서 운영하는 2024년 하반기 서울역사강좌 교재로도 사용된다. 8월 23일 이후 서울역사편찬원 누리집의 전자책 서비스를 이용하여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서울시내 주요 공공도서관에도 무상 배포할 예정이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책방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은 우리의 역사를 품고 있다.”며 “이 책을 읽는 여러분 모두가 땅속에 감춰졌던 역사의 흔적을 통해 그 가치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